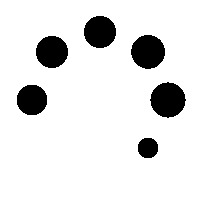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의 봄, 실화와 픽션의 결합
영화 '서울의 봄'은 12·12 사건을 재현하면서 당시 신문 사진, 국회 청문회 속기록 등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2가지 이유 때문에 완벽한 실화 재현은 불가능했습니다. 첫째, 군 내부기록이 비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둘째, 피해자, 가해자, 생존자 등 주체별로 증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완벽한 서사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해,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픽션으로 구성해 관객들의 창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연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사 차량 헤드라이트를 클로즈업한 장면은 '쿠데타의 시동'을 상징하며, 이를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을 장악한 군대의 트럭 행렬'을 보여줌으로써, 1980년에 광주에서 일어날 폭력 사태를 예상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팩트에 기반하면서도 나머지 부분은 스토리텔링으로 공백을 메워, 관중들에게 역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줍니다. 특히,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난 당시의 뉴스 화면과 배우들의 재연 장면을 교차하여 보여줌으로써, 역사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몰입을 도와주는 픽션 요소들
탄탄한 실화의 뼈대 위에 놓인 픽션 요소들은 관객 몰입도를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영화는 픽션 부분에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을 출연시켜서 감정선에 몰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장민우' 대위입니다. 그는 보안사에 투입된 신입 장교로, 헌법을 수호하는 것과 쿠데타의 명령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인물의 시선을 통해 관객들은 쿠데타가 윤리적으로 모순점이 많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편 시간 압축 효과를 보여주는 픽션 장치도 곳곳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9시간 이상 진행되었던 충청로 난투극을 12분으로 응축하여 긴박감 있게 표현합니다. 또한, 난투극이 끝난 후 통제실에 불이 꺼져있는 장면은 '권력의 단절'을 상징하면서, 언론 통제가 되었던 공포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와 더불어, 배경음악 또한 픽션 요소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적이 작곡한 메인테마곡은 전반부에서는 군홧발의 박동을 표현하지만, 후반부에는 현악기를 사용해 당시 상황을 겪었던 시민들의 분노 감정을 표현합니다. 장민우 대위의 내면 독백은 짧은 내레이션으로 각 장면에서 표현되는데, 이는 관객이 그의 생각과 감정 변화를 따라가면서 깊게 몰입하도록 도와줍니다.
영화 흥행과 관객의 긍정적인 피드백
‘서울의 봄’은 개봉 첫 번째 주에만 관객 230만 명을 돌파하면서 영화 ‘1987’ 이후 한국 현대사를 다룬 작품 중 가장 높은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2주 차에는 500만 관객이 관람을 하게 되면서 손익분기점을 가뿐하게 넘어섰습니다. 박스오피스 모니터링 웹사이트에 의하면 국내 매출과 해외 선판매를 포함해 총수익 약 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관람객은 40대, 5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20대 비중도 약 30% 로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봉 3주 차에는 역사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단체관람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즉 전 세대에 걸쳐 관심을 많이 받은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SNS에서도 '서울의 봄' 해시태그 노출 수가 300만 건을 넘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바이럴 홍보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화가 끝나고 올라오는 엔딩 크레디트에는 12·12 사태와 관련된 실제 사진들과 국민들이 기록한 흑백 영상들이 나오는데, 이는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줍니다. 또한 45년 전 이야기를 다루지만, 관객이 '현재'를 반추하게 만드는 요소를 곳곳에 심어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역사에 대해 알고 있어야,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관객 만족도 조사에서 '한번 더 관람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약 60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9년에 나온 '기생충'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