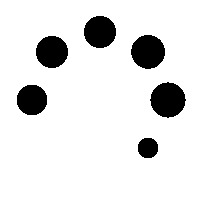티스토리 뷰
목차

설국열차에서의 권력: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
'설국열차'는 지구가 종말 된 이후의 세계를 배경으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지구 종말 후 유일하게 생존한 인류가 설국 열차 안에서 살아남으면서 계급 사회를 유지하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설국 열차는 권력 구조를 나타내는 공간이며, 최고의 권력자인 윌포드는 열차의 엔진을 컨트롤하며 막강한 절대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합리화합니다. 권력층에 의해 통제받는 상황에서도 열차 안의 사람들은 그것이 질서유지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권력 시스템'을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보면, 사회의 불평등한 요소들이 보이더라도 이러한 권력에 순응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를 자아내는 장면은 영화 후반부에서 윌포드가 반란을 도모한 커티스에게 후계자 자리를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권력자가 기존의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항 세력까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포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러한 연출을 통해 권력이 폭력을 통해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뇌나 포섭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커티스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고 엔진실을 걸어 나오는 장면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끝내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 영화는 관객에게 "나 또한 절대 권력을 합리화하도록 순응해오지 않았나? 지금의 권력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복종: 기존 체제에 순응하기로한 인간의 선택
설국열차의 가장 꼬리부분에 탑승한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빈곤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권력층에 복종하도록 오랜 시간 길들여져 있기에 반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는 조직이나 사회에서 권력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현대사회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특히 단백질 블록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배급받아서 먹는 장면은 이러한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라면, 불합리한 것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인류의 적응 방식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지배세력에 의한 반복되는 통제력을 경험하면서 자존을 내려놓고 현재의 체제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메이슨은 이러한 모습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말투나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 꼬리칸의 사람들이 기존 체제에 순응하도록 세뇌시킵니다. 꼬리칸 사람들은 이에 무기력함을 느끼고 반항하지 않기에 권력체계를 정당화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이 영화는 평소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복종하고 순응하던 것에 대해 의심을 던져보도록 해줍니다.
자유의지: 인간다움의 회복 혹은 환상
이 영화는 설국열차에 살던 사람들이 열차 밖으로 탈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윌포트가 권력을 넘기겠다는 매력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티스는 이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설국열차의 불공평한 권력시스템을 파괴해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기존 권력체제의 붕괴를 통해 새로운 사회가 열리는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결말은 한 사회가 자유를 얻기까지 생각의 전환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왔던 인류의 역사적 사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편, 봉준호 감독은 이러한 결말을 통해 '이렇게 얻은 자유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가?'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설국열차를 탈출함으로써 인간들은 권력의 복종에서 벗어나 자유의지를 얻게 되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요나와 남자아이가 하얗게 눈덮인 광활한 세상에 놓이는 장면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위험, 불확실성, 혼란을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