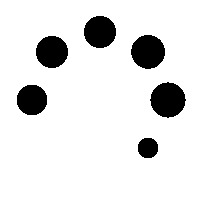티스토리 뷰
목차

안나 카레니나, 욕망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말
영화 ‘안나 카레리나’의 주인공 안나는 남편과 아이가 있는 유부녀이지만 미혼의 매력적인 남성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져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녀는 당시 보수적인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인 사랑의 욕망 사이에서 내적인 갈등으로 고통을 겪는 인물입니다. 원작 소설의 작가인 톨스토이는 안나를 통해 도덕적인 기준 속에서 처참히 무너져가는 한 인간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영화 '안나 카레니나'는 안나의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극적인 연출들을 통해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안나는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져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의 감정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불륜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사회적 비난을 견디기 어려워 하며, 브론스키에 대한 안나의 사랑은 강한 집착과 불안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다 보니 브론스키는 안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런 모습에 안나는 극심한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브론스키와 함께 떠나게 되면서 평화로운 가정을 깨고 나와 아들까지 버렸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안나가 기차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드앤딩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한편, 불륜녀로 낙인찍혀서 사회적으로 매장 당한 안 나와 달리, 브론스키는 사회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같은 불륜에도 성별에 따라 이중적인 시선으로 대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브론스키와 카레린, 다른 유형의 인물들
안나의 남편 카레린과 안나의 불륜상대인 브론스키는 전혀 다른 유형의 인물입니다. 브론스키는 매력적인 인물로 묘사되지만, 한편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랑은 빠르게 불타오르지만 빠르게 식기도 합니다. 안나가 자신과 불륜을 저지른 이후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고립되게 되면서, 오히려 안 나와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책임감 없는 자유연애의 허상에 대한 톨스토이의 비판적인 시선을 보여줍니다. 한편 안나의 남편 카레린은 매우 보수적이고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 인물로 표현됩니다. 그는 당시 러시아 귀족 사회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안나의 외도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불안감과 모멸감으로 괴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사회적 체면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안나가 이혼을 요구해도 선뜻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안나는 카레린을 배신하고 난 뒤에 생긴 그와의 거리감, 그리고 브론스키와 감정적으로 소원해지면서 생긴 불안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됩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사랑의 삼각관계를 다루는 것을 넘어, 사랑, 권력, 도덕이 충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톨스토이가 던지는 철학적인 질문과 영화적 해석
'안나카레리나' 소설의 작가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본성, 사회적 규범 등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철학적 주제들을 던집니다. 그는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면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인해 한 개인이 어떻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묘사하려고 합니다. 한편, 톨스토이는 브론스키와 안나 커플과 대비되는 레빈과 키티 커플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브론스키와 안나 커플은 불꽃처럼 타올라서 급속도로 사랑이 식어버리는 양상을 보입니다. 반면, 레빈과 키티 커플은 잔잔하고 평범하지만,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안정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맞추어가면서 일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나가며 성장하는 건강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영화에서는 세련된 시각적 장치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톨스토이의 철학적 관점을 극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연극무대처럼 보이는 세트와 적절한 OST를 활용해 인물이 마주하는 감정들을 다채롭게 묘사합니다.